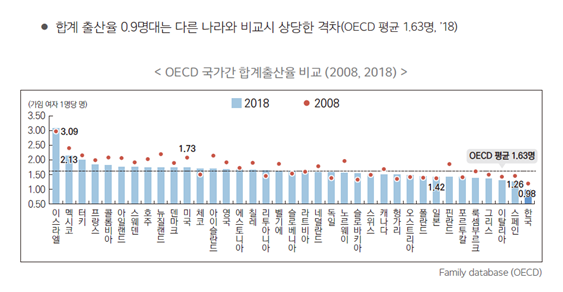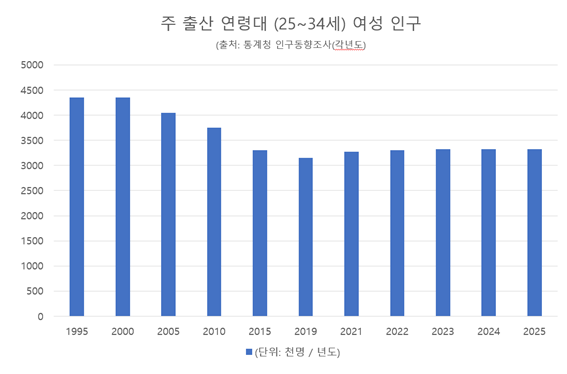[코이오스의 뷰 ⑪]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여성 운동선수가 수년간 훈련하며 자신의 인생을 스포츠에 바쳤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최근까지 남성으로 경쟁해온 상대와 맞붙어 본질적인 신체적 열세로 인해 명백한 불공정함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이러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여성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참여하는 것이 초래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권리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 자주 논의되지 않는 이 문제는 여성 운동선수의 삶에 실제적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은, 호르몬 요법 이후에도 남아 있는 생리학적 이점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트랜스젠더 개인이 자신의 성 정체성과 신체적 특성을 일치시키도록 돕는 치료입니다(Mitchell). 그러나 이러한 이점은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위협하며, 현재의 규정을 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Wiesman).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무례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공정성을 지키고 스포츠 경쟁의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 성 기반 구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합니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논쟁의 이해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종목에 참가하는 문제는 공정성과 대표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스포츠는 신체적 차이를 고려해 성별에 따라 분류되어 왔으며, 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성 시절 발달한 근육량, 폐활량, 골밀도 등의 생리학적 이점을 일부 유지하게 되면서(Wiesman), 이러한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반면,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트랜스젠더의 포용은 정체성과 다양성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Mitchell). 그러나 윤리적 측면에서 볼 때, 공정성과 무결성은 스포츠의 기본 원칙입니다. 형평성의 원칙은 경쟁자 간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고,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반합니다. 다양성과 공정성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포용적이면서도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포함을 지지하는 입장
포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트랜스젠더 개인의 존엄성과 대표성 보장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 스포츠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양성을 증진하고 소외된 집단에 대한 수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 말합니다(Mitchell). 이는 인권의 연장선으로, 모든 이가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또한,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며, 트랜스젠더 개인에게 낙인을 찍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포용이 정신 건강 개선과 공동체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도 말합니다(Mitchell).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스포츠의 공정성과 관련된 더 넓은 함의와 비교해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트랜스젠더 여성을 여성 스포츠에 포함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생리학적 차이입니다. 사춘기 동안 형성된 근육량, 테스토스테론 수치, 유산소 능력 등은 경쟁에서 명백한 이점을 제공합니다(Donohue). 호르몬 치료로 일부 차이는 줄일 수 있지만, 남성 사춘기를 거치며 형성된 신체적 이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Stover 3).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2개월 간의 테스토스테론 억제 이후에도 트랜스젠더 여성은 시스젠더 여성보다 더 높은 근육량과 근력을 유지했으며, 대퇴사두근(허벅지 근육) 크기는 평균 35% 더 컸고, 근력은 48% 높았습니다(Hillborne).
실제 경기에서도 이러한 이점은 드러납니다.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리아 토마스는 남자부에서 활동하던 중 성전환 후 여성부로 옮겨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남자부에서 토마스는 500야드 자유형 전국 랭킹 462위, 200야드 자유형 554위였으나, 여성부로 옮긴 뒤 2022년 NCAA 여자 1부 챔피언십 500야드 자유형에서 우승했습니다(“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그녀와 경쟁한 여성 선수들은 심각한 불공정을 느꼈으며, 수년간의 노력과 훈련이 생물학적 차이로 무너졌다고 토로했습니다. 경쟁자 중 한 명인 케이틀린 휠러는 “우리 팀원들과 나는 최고의 무대에서 경쟁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부인할 수 없는 생물학적 이점을 가진 선수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말했습니다(Wheeler). 휠러는 이어서 “공정성과 안전은 남성의 포용을 우선하는 정책 속에서는 공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잠재적 해결책
우선, 여성 스포츠와 공간에서 남성을 배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스포츠가 존재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 간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며, 이 구분을 보호하지 않으면 공정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Wheeler). 또한, 휠러는 리아 토마스와 같은 남성과 탈의실을 공유해야 했던 경험을 들며, 여성들이 남성과 함께 탈의실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사적인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Wheeler).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리나 오픈 리그를 만드는 것입니다(Nokoff, 2023). 이는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경쟁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성 정체성만이 아니라 생리학적 지표에 기반해 경기 참가 자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참가를 허용하는 성능 기반 기준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Nokoff, 2023).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며, 선수, 스포츠 조직, 전문가 간 협력을 통해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Riley Gaines 센터와 같은 단체는 여성 운동선수를 지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윤리적 함의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 문제는 단순히 운동경기 문제를 넘어, 사회적·윤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Title IX(성차별 금지법) 같은 제도를 통해 평등한 기회를 위해 싸워온 여성 운동선수들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로 인해 여성들이 챔피언 타이틀, 기록, 장학금, 팀 내 자리 등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들이 남성과 탈의실을 공유해야 하는 등 안전과 존엄성,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Wheeler).
한 가지 중요한 사회적 우려는 젊은 여성 운동선수들의 참여 위축입니다.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목격한 소녀들이 자신의 노력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경쟁 의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코네티컷주의 고등학교 육상 선수들은 두 명의 트랜스젠더 선수가 주 대회를 지배하고 기록을 경신하자, 큰 실망과 좌절감을 표현했습니다(Barnes). 이러한 사례는 스포츠를 향한 여성들의 열망과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여성 스포츠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와 대중의 관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포용 정책이 지속된다면, 생물학적 여성이 상위 레벨 경기에서 점점 줄어들고, 경기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관중의 관심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Barnes).
윤리적으로도 상충되는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핵심 문제입니다. 여성 운동선수는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경쟁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격투기 선수인 팔론 폭스의 사례는 이러한 윤리적 갈등을 잘 보여줍니다. 전환 이후 여성부에 참가한 폭스는 더 높은 골밀도와 근육량 등의 신체적 이점으로 인해 상대 선수에게 위험을 초래했고, 실제로 경기 중 한 선수가 안와골절을 입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Stover 4). 이처럼 생물학적 차이는 상대 선수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Title IX의 해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이 트랜스젠더 포용으로 인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경우,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Save Women’s Sports와 같은 단체는 여성 스포츠의 범주를 보호하고 Title IX의 본래 취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Colemen 5).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여성 선수, 트랜스젠더 개인, 정책 입안자, 스포츠 단체가 함께 공정성과 포용성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Colmen 5).
결론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는 공정성과 경쟁 무결성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존중은 중요하지만, 이로 인해 스포츠의 본질인 공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연구, 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모든 당사자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여성 스포츠의 미래는 정의와 무결성을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성 스포츠는 생물학적 차이를 전제로 존재합니다. 이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공정성과 평등의 기반을 파괴하는 일입니다”(Wheeler).
* 본 기사는 ESG코리아뉴스 미국 학생기자 에마 사르미엔토(Emma Sarmiento)의 영문 오피니언으로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Transgender Athletes
by Emma Sarmiento
Imagine a female athlete training for years, dedicating her life to her sport, only to face an opponent with a physiological edge that leaves her at a significant disadvantage. An opponent who, until recently, competed as a male. Such instances have sparked debates worldwide, highlighting the challenges posed by including transgender athletes in women’s sports.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transgender women in female sports raises complex questions about fairness and safety. These developments impact the lives of female athletes in ways that are often under-discussed due to the influence of the transgender rights movement. The need to preserve the integrity and fairness of competition is of the utmost importance.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in women’s sports raises concerns about unbiased competition due to the physiological advantages that persist despite hormone therapy. This medical treatment helps transgender individuals align their physical characteristics with their gender identity (Micthell). These advantages may undermine the principles of fairness in women’s athletics, leading to reconsidering current competitive policies (Wiesman). Although denying transgender women opportunities in sports might be viewed as inconsiderate and insensitive, some argue that maintaining sex-based divisions in competitive sports is necessary to ensure fairness and uphold the integrity of athletic competition.
Understanding the Debate on Transgender Athletes
Transgender athletes are individuals whose gender identity differs from their sex assigned at birth. In sports,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in female categories has sparked debates about fairness and representation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Sports have traditionally been divided by sex to account for biological differences that impact performance. These categories aim to ensure fair competition. Critics argue that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in women’s sports undermines this fairness due to physical advantages, such as greater muscle mass, lung capacity, and bone density, that are retained even after hormone therapy (Wiesman). From a societal perspective, supporters of inclusion argue that sports should reflect evolving understandings of identity and diversity (Mitchell). Yet, from an ethical standpoint, fairness and integrity remain fundamental. Principles of equity require acknowledging physical differences that may exist between individuals, particularly in competitive sports, to ensure a level playing field for all participants. Respecting both diversity and competitive fairness is essential in shaping inclusive yet just athletic environments.
Arguments Supporting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Athletes
Proponents of including transgender athletes emphasize representation and respect for trans individuals. Following the views of society,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fosters diversity and sends a message of acceptance to marginalized groups (Mitchell). From this standpoint, inclusion aligns with human rights, ensuring that all individuals have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sports.
Advocates argue that excluding transgender women from women’s sports is discriminatory and causes stigma against transgender individuals. They also highlight the psychological benefits of inclusion, such as improved mental health and community acceptance for transgender athletes (Mitchell). While these arguments have merit, they must be weighed against the broader implications for fairness in competition.
Concerns Over Competitive Fairness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to including transgender women in women’s sports lies in the phys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ales and females. These differences, established during puberty, include greater muscle mass, higher levels of testosterone, and superior aerobic capacity, all of which provide competitive advantages (Donohue). While hormone therapy can reduce some of these differences, it cannot entirely eliminate the physical advantages gained through male puberty (Stover 3). Research indicates that transgender women may maintain certain physical advantages over cisgender female athletes (Donohue). A study published in the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found that after 12 months of testosterone suppression, transgender women retained higher muscle mass and strength compared to cisgender women. Specifically, they remained 48% stronger, with 35% larger quadriceps mass compared to the control population of cisgender women (Hillborne).
Examples from real-life competitions illustrate the impact of these advantages. Lia Thomas, a transgender swimmer, transitioned after competing in men’s events and achieved significant success in women’s swimming. As a male swimmer, Lia Thomas was ranked 462nd nationally in the 500-yard freestyle and 554th in the 200-yard freestyle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After transitioning, Lia Thomas won the 500-yard freestyle at the 2022 NCAA Division I Women’s Championship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Female athletes competing against Thomas have expressed frustration, feeling that their years of training and dedication were overshadowed by an inherent physical disparity. Kaitlynn Wheeler, who faced Thomas in competition, described the experience as fundamentally unfair, highlighting the emotional and psychological toll on female athletes. “My teammates and I trained our entire lives to compete at the highest level, only to have someone with an undeniable biological advantage take away everything we had worked for” (Wheeler).
The ethical dilemma of balancing inclusivity with fairness is profound. Without clear guidelines,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athletes risks undermining the principles that make competition meaningful. While interviewing Kaitlynn Wheeler, she emphasizes the fact that “Fairness and safety cannot coexist in policies that prioritize inclusion of men at the expense of women” (Wheeler).
Potential Solutions for Fair Competition
First and foremost, keeping men out of women’s sports and spaces is critical. “Women’s sports and sporting categories exist because of b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and fairness is impossible without protecting that distinction”(Wheeler). Wheeler continues by advocating for the assurance that women have safe, private locker rooms where they’re not forced to undress in front of men, speaking from experience when she shared a locker room with Leah Thomas (Wheeler).
Addressing the challenges posed by transgender inclusion in sports requires innovative solutions. One potential approach is the creation of separate categories or open leagues for transgender athletes (Nokoff, 2023). This would allow individuals to compete without compromising the fairness of women’s sports.
Another solution involves adjusting eligibility criteria based on physiological metrics rather than solely relying on gender identity. For example, governing bodies could establish performance-based thresholds that ensure fair competition (Nokoff, 2023).
Further research is essential to develop evidence-based guidelines that balance fairness and inclusion. Collaboration among athletes, sports organizations, and experts is critical in crafting policies that respect all collaborators. Initiatives like the Riley Gaines Center advocate for fair competition while supporting female athletes and fostering dialogue around these complex issues.
Societal and Ethical Implications
The debate over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in women’s sports has profound societal and ethical ramifications that extend far beyond simply athletics. Female athletes, who have historically fought for equal opportunities through movements like Title IX, now face a new challenge that threatens the level playing field they have worked so hard to achieve. Women are losing championships, records, scholarships, and even spots on teams to men who have undeniable biological advantages. Beyond the competition, it forces women into vulnerable situations, such as sharing locker rooms with men, which compromises their safety, dignity, and privacy (Wheeler). Allowing transgender women to compete in women’s sports raises concerns about whether the strides made toward gender equity are being undermined.
One significant societal implication is the potential deterrent effect on young female athletes. Girls who perceive an uneven playing field may lose motivation to compete, feeling that their efforts are futile against competitors with inherent physical advantages. For example, high school track athletes in Connecticut expressed frustration and disappointment when two transgender athletes dominated state championships, breaking records and securing opportunities that some felt would otherwise have gone to cisgender female athletes (Barnes). Such scenarios risk creating a disheartening environment for young women who aspire to excel in sports.
Another societal concern involves the broader implications for women’s sports as a whole. Over time, if transgender inclusion continues without addressing fairness, there is a risk that biological women may become underrepresented in elite competition. This could lead to diminished public interest in women’s sports, as spectators may question the legitimacy of outcomes and lose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the competition (Barnes). The long-term consequence could be a rollback of the progress achieved in raising the profile of women’s sports globally.
From an ethical standpoint,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raises questions about how to balance competing rights. Female athletes deserve a fair and equitable environment in which to compete.
Examples like that of Fallon Fox, a transgender mixed martial artist, further highlight the ethical dilemmas. Fox, who transitioned later in life, faced criticism for competing in women’s MMA fights due to her physical advantages, including greater bone density and muscle mass. Critics argued that these attributes posed a safety risk to her opponents, one of whom suffered a broken orbital bone during a match (Stover 4). This case illustrates the ethical conflict of ensuring the safety and well-being of competitors.
The debate also has implications for Title IX protections, which were originally designed to ensure equal opportunities for women in education and sports. If transgender inclusion is perceived as undermining these protections, it could lead to legal challenges and a reevaluation of policies governing women’s sports. Organizations such as Save Women’s Sports have emerged, advocating for the preservation of female athletic categories and calling attention to the potential erosion of Title IX’s original intent (Colemen 5).
To address these societal and ethical challenges, it is vital to promote discussion among all collaborators. Female athletes, transgender individuals, policymakers, and sports organizations must work together to develop solutions that prioritize fairness. Encouraging open conversations and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can help bridge the divide and create a more inclusive yet equitable sporting environment (Colmen 5).
Ultimately, the debate over transgender inclusion in women’s sports is an issue of broader societal challenges in balancing rights and fairness. As society continues to grapple with these issues, we must strive to find solutions that uphold the principles of justice and integrity.
Conclusion
The inclusion of transgender women in women’s sports raises critical questions about fairness and competitive integrity. While showing compassion towards individuals’ identities is important, these goals must not undermine the foundational principles of fairness in competition.
The path forward requires continued dialogue, research, and collaboration. As society grapples with these issues, it must prioritize fairness while honoring the dignity of all individuals involved. The future of women’s sports depends on our ability to find solutions that uphold the principles of equity and integrity. “Women’s sports exist because biological differences matter. Ignoring that truth destroys the foundation of fairness and equality” (Wheeler).
Bibliography
Barnes, Katie. “Transgender Athlete Laws by State: Legislation, Science, More.” ESPN, ESPN Internet Ventures, 24 Aug. 2023, www.espn.com/espn/story/_/id/38209262/transgender-athlete-laws-state-legislation-science
Donohue, Brian. “Expert: Science Won’t Resolve Debates about Trans Athletes - UW Medicine.” Newsroom, 17 Oct. 2023, newsroom.uw.edu/blog/expert-science-wont-resolve-debates-about-trans-athletes.
Coleman, Doriane, and Wickliffe Shreve. “COMPARING ATHLETIC PERFORMANCES THE BEST ELITE WOMEN TO BOYS AND MEN.” Duke Edu., 2017, web.law.duke.edu/sites/default/files/centers/sportslaw/comparingathleticperformances.pdf.
Hilborne, Stephanie. “Trans Inclusion & Women’s Sport - Women in Sport.” Women in Sport, 2023, womeninsport.org/transgender-inclusion-womens-sport/?utm.
Mitchell, Micah. “In Sports and in Life, Trans Women Deserve Equal Access.” ACLU of Ohio, 8 Mar. 2023, www.acluohio.org/en/news/sports-and-life-trans-women-deserve-equal-access.
Nokoff, Natalie J. “Sex Differences in Athletic Performance: Perspectives on... : Exercise and Sport Sciences Reviews.” Sex Differences in Athletic Performance: Perspectives on Transgender Athletes, 4 Apr. 2023, journals.lww.com/acsm-essr/fulltext/2023/07000/sex_differences_in_athletic_performance_.2.aspx?context=featuredarticles&collectionid=2.
Spratt, Ed. “British Cycling Limits Transgender Women Competing in Female Categories.” PinkBike, 26 May 2023, www.pinkbike.com/news/british-cycling-limites-transgender-women-competing-in-female-categories.html.
Stover, John. “Opposition to Ohio Senate Bill 1.” Protect Ohio Children Coalition, Protect Ohio Children, 21 Feb. 2023.
“Transgender Student-Athlete Participation Policy.” NCAA.Org, May 2024, www.ncaa.org/sports/2022/1/27/transgender-participation-policy.aspx.
Weisman, Dennis L. “Transgender Athletes, Fair Competition, and Public Policy.” Https://Www.Cato.Org/Regulation/Fall-2022/Transgender-Athletes-Fair-Competition-Public-Policy.” Cato.Org, CATO Institute, 2022, www.cato.org/regulation/fall-2022/transgender-athletes-fair-competition-public-policy.
Wheeler, Kaitlynn. Interview. Conducted by Emma Sarmiento, 20 November 2024.